
어제는 첫눈이 온다던 소설(小雪)에 눈 대신 비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산책길에는 떨어진 잎들이 수북했습니다. 그 잎들을 보니 불귀(不歸). 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나 죽으면 하늘로 돌아갈래.’라고 했지만, 떨어진 잎들은 하늘로도, 원래 있던 나무로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그들은 촉촉이 적어 있은 채 자신의 온몸을 다해 부스러질 따름입니다. 흙의 거름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잎들은 그저 그렇게 살다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잠시 그 잎들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여름을 혼신의 힘으로 살다 사라지는 매미처럼 계절이 바뀌면 어김없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바람에 몸을 실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고, 어스름한 날들이 많아지고, 나무는 앙상한 몸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절에 이제 소멸하기 시작하는 것들에게 잠시 귀 기울여 봅니다.
* 신청곡: 조명섭, ‘계절이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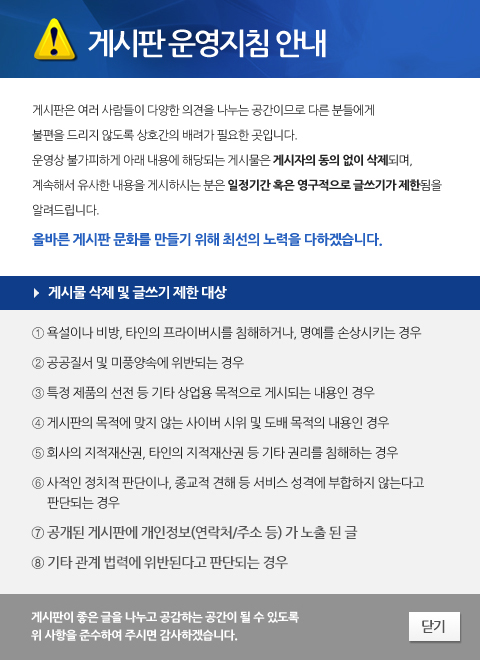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