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향연
새벽녘 구슬 같은 봄이슬을 밟으며 봄바람을 입에 한가득 물고 집을 나섰다.
반시간이나 지났을까 이름모를 봄새들이 지저귀고 냉이 달래 향과 이도 모자라
노란개나리 만발 하여 어둠을 밝혔다. 아쉬운것은 백옥같이 하얀 목련이 이미
꽃봉우리가 낙화 하여 나비떼 같이 바람에 날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꽃잎을 밟으면 밟을 수록 너무 마음이 아팟다. 마을을 지나 골짜기로 들어
서려는데 이게 웬 일인가 기차화통 소리같은 갑자기 봄꿩이 우지짖는게
아닌가 2m도 안되는 바로 옆에서 풀잎을 날리며 푸드득 날아 "꼬공꼬공" 하고
우는 소리가 아니 짙는 소리에 얼마나 놀랏는지 모른다. 날이 어스름하게 밝았어도
돌연 사나운 짐승을 만난듯 가슴이 한참 떨렸다.
아! 이것은 놀랄게 아니라 봄의 아지랑이 악단에서 봄을 연주한게 아닌가 여겨저
발걸음이 가벼웠다. 요 며칠간은 봄비가 짓궂게 내려 산책을 못했는데, 이젠 따스한
봄이 가기전에 매일 이불을 강제라도 제치고 나오려 한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나무가지가 검으틱틱 했었는데 물감을 입가득 물고 온힘을 다하여 뱉은듯
갑자기 수양버드나무들이 연푸른 빛이 나의 눈을 즐겁게 했다.
호수에는 고니떼가 꾹꾹 묵직한 노래를 하며 목을 높이 휘두르고 청둥오리는
무엇을 잡으려는지 연실 물속을 들락 거리기에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미 개구리가 입이 떨어지고 대동강 얼음이 녹는다는 경칩과 우수 절기가 지나서인지
완연한 봄이 곁에 와 있으매 굳게 잠긴 내 맘의 문도 스르르 열리는 듯 하다.
전 지구촌이 코로나로 역경을 겪고 있어 누구나 건강을 챙기려 방안에서 숨통이 터지는
시민들이 많을텐데도 마스크를 항시 벗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인가
모두에게 알린다. 답답하면 혼자라도 들로 산으로 나와 봄볕을 아니 화사한
봄날에 붉지도 희지도 안은 연분홍의 두견화를 즈려 밟으며 산책해 봄이
어떨지 감히 권하고 싶다.
새벽녘 산으로 들로 나서면 동심의 나래를 펴고 자신도 모르게 릴리날라
노래가 나올것이다. "봄처녀 제 오시네" 하며 옛 어릴때 버들피리 소리를 연상하면서 말이다.
"코로나여 멀리 물러 나거라 어이 끈질기게 우릴 봄맛을 잃게 하느냐"며
주문을 외우다시싶이 하며 굳은 의지로 밖으로 밖으로 나서보자고 외처본다.
붉은 복숭화 꽃이 피는 3월이 가기전 이 좋은 시절에 봄의향연을 만끽하면서
말이다.
신청곡
봄이 온단다-박강수
이건원. 강원 강릉시 오죽헌 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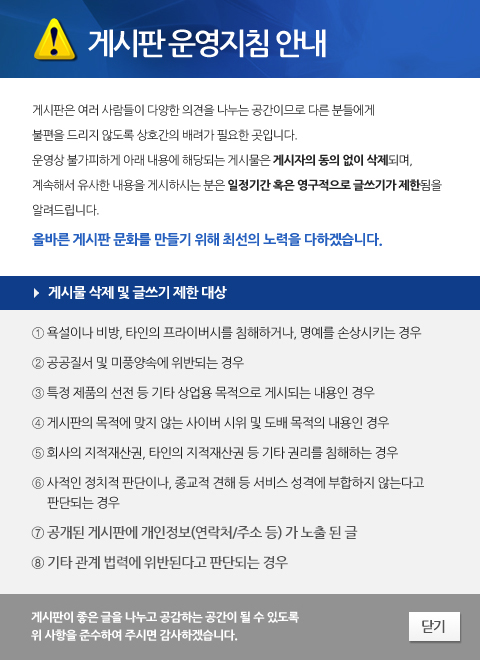
댓글
()